[멘토의 비법] AI도 못 쓰는 글이 있습니다


요즘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장 먼저 AI를 켜게 됩니다. 회의록 정리도, 메일 작성도, 보고서 초안도 빠르게 생성해 주니 아주 유용하지요. 텍스트를 다루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쓰던 글의 많은 부분을 이제 기계가 대신 써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해도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글쓰기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에서 비롯된 글쓰기입니다.

복제할 수 없는 이야기
경험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겪은 사람만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함께한 팀원들이라도, 기억하는 장면과 감정은 제각기 다릅니다. 누군가는 클라이언트의 마지막 한 마디를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마지막 야근 뒤 사무실의 조용한 공기를 기억합니다. 그 차이에서 글이 만들어집니다.
경험을 쓴다는 건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 안에서 내가 느낀 감정, 생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요구사항을 바꿨다”라는 문장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순간,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문장을 더하면 그 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이야기’가 됩니다.

글로 쓰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글을 써 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저 정신없이 지나간 하루였는데, 막상 글로 적어 보니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는걸요. 순간순간 느낀 당혹감, 감사함, 아쉬움 같은 감정들이 글이라는 그릇 안에서 모양을 갖추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땐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때 내 안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보는 힘도 글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 힘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경험을 글로 옮기는 연습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을 글로 옮길 수 있을까요? 꼭 글을 잘 쓰는 사람처럼 멋진 문장을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말을 꺼내는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아릿해졌습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을 붙잡아보는 겁니다. 그 사소한 순간이 사실은 그날의 핵심일 수도 있고, 우리가 놓친 통찰일 수도 있습니다. 글은 사소함을 의미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때 내가 왜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 있다면, 분명 그 안에는 당신만의 감정이나 메시지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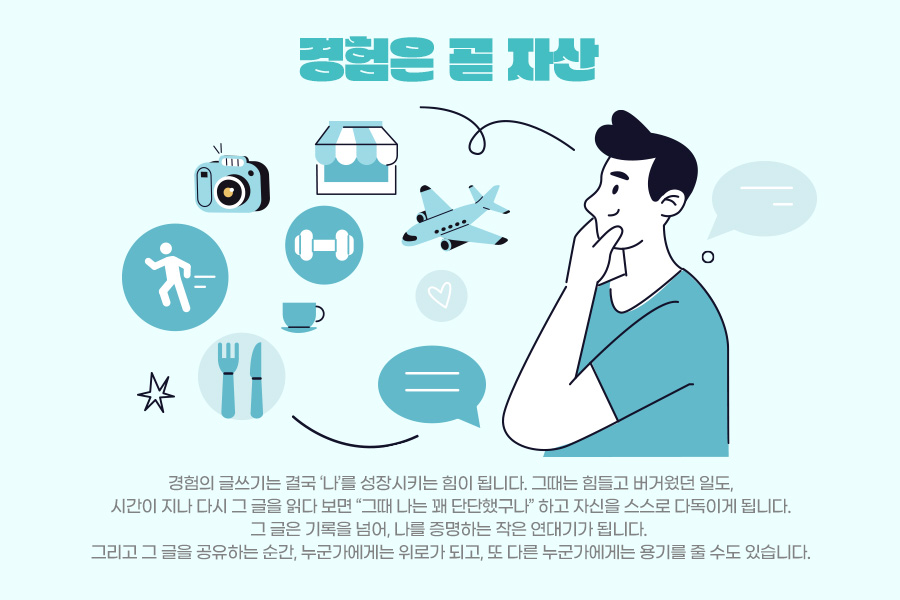
경험은 곧 자산이 됩니다
경험의 글쓰기는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때는 힘들고 버거웠던 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그 글을 읽다 보면 “그때 나는 꽤 단단했구나” 하고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게 됩니다. 그 글은 기록을 넘어, 나를 증명하는 작은 연대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공유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글을 쓰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누구나 다 비슷한 글을 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중요한 건 나만 꺼낼 수 있는 문장입니다.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그 글은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휴비스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